병원급 의료기관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늘었다 , 상급종합병원급 입원환자 수도 23명*으로 최근 4주 연속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입원환자수가 최근 5주 연속 증가하고, 8월 중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일반국민들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일반국민들은 기침, 재채기 시 옷 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는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줄 것을 권고하였다. 질병관리청에따르면 주차(’25.7.27~8.2) 코로나19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221개소)의 입원환자 수는 220명으로 최근 4주간 약 2배 증가하면서, 5주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 (최근 4주) (28주) 103명 → (29주) 123명 → (30주) 139명 → (31주) 220명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3,526명)의 60.0%(2,114명)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3%(647명), 19~49세가 9.6%(340명)의 순이었다. 상급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콧물을 이용해 만성 비부비동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다. 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나민석 교수, 용인세브란스병원 이비인후과 문서진 교수, 연세대 의과대학 이비인후과학교실 문성민 박사 연구팀은 콧물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제2형 만성 비부비동염을 진단할 수 있다고 8일에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유럽 알레르기 임상면역학회지 ‘알러지(Allergy, IF 12.0)’에 게재됐다. 만성 비부비동염은 비강(nasal cavity)와 부비동(paranasal sinus) 점막에 발생하는 만성 염증성 질환이다. 코막힘, 콧물, 안면 통증 또는 압박감, 후각 저하 등이 주요 증상이다. 만성 비부비동염은 염증 양상에 따라 크게 제2형(type 2)과 비2형(non-type 2)으로 구분하한다.제2형과 비2형은 발생 기전과 치료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춘 정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전 진단이 중요하다. 제2형을 가장 정확히 진단하는 방법은 점막 조직을 통한 병리학적 검사이지만 수술, 조직 생검 등 침습적인 방식으로 이뤄져 환자에게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소요되어 일상 진료에 적용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환자 통증이나 불편감 없이 쉽게 얻을
온코닉테라퓨틱스(476060)는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신약 ‘자큐보(성분명: 자스타프라잔시트르산염)’의 특허 존속기간 연장을 특허청으로부터 승인받았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특허 연장은 자큐보의 핵심 물질 특허인 ‘이미다조[1,2-a]피리딘 유도체, 이의 제조방법 및 이의 용도’에 대해 청구된 것으로, 기존 특허 만료일인 2036년 7월 5일에서 2040년 9월 13일까지로 약 4년 2개월 연장됐다. 특허청은 최근 해당 연장 등록을 공식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 등으로 인해 실제 특허 실시 기간이 줄어드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5년까지 특허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는 신약 개발 기업의 지식재산 보호 및 시장 경쟁력 확보에 핵심적인 장치로 평가된다. 자큐보는 온코닉테라퓨틱스가 24년 4월 허가받은 국산 37호 신약으로, P-CAB 계열 위산분비억제제다. 기존 PPI 계열 치료제 대비 빠른 약효 발현과 우수한 야간 위산 조절 능력을 갖춰, 위식도역류질환뿐 아니라 최근에는 위궤양 적응증까지 확대 승인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자큐보는 지난해 10월 출시 이후 1년이

난치성 교모세포종에 대해, 전임상 마우스 모델에서 줄기세포 기반 면역유전자 치료와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한 새로운 면역치료 전략으로 장기적인 항종양 면역 효과를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 교모세포종(glioblastoma)은 뇌종양 중에서도 가장 악성도가 높고 치료가 어려워 표준치료를 받더라도 평균 생존기간이 15개월에 불과하고 5년 생존율은 10% 미만에 머무는 치명적인 질환이다. 수술, 방사선, 항암치료를 병행해도 대부분 재발하는 데다, 재발 후 마땅한 치료제도 없어 암 중에서도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가장 시급한 치명적인 난치성 암으로 꼽힌다. 서울성모병원 신경외과 안스데반 교수(사진)팀은 뇌종양에 특이적으로 이동하는 중간엽 줄기세포(MSC)를 이용해 강력한 면역활성 인자인 인터루킨-12(IL-12)를 종양 미세환경 내에 직접 전달하고, 여기에 PD-1 면역관문억제제를 병용함으로써 교모세포종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장기 면역 효과를 입증했다. 연구는 면역 마우스 모델에 교모세포종을 이식한 후, ▲항PD-1 항체 단독투여, ▲줄기세포 기반 IL-12 전달(MSC_IL-12) 단독투여, ▲두 가지 병용투여의 세 그룹으로 나누어 치료 반응을 비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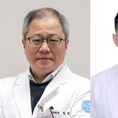
분당서울대병원 재활의학과 임재영 교수팀(순천향대천안병원 재활의학과 임승규 교수)의 연구 결과 인지기능 저하가 동반된 근감소증 환자 10명 중 6명(60.8%)만이 고관절 골절 수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타인의 도움 없이 걸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근감소증만 앓는 환자(81.8%)보다 26% 가량 낮은 수치로, 인지기능 저하와 근감소증을 같이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보다 최적화된 재활 치료법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고관절 골절은 하체의 움직임을 만드는 골반과 넓적다리 사이의 뼈 ‘고관절’이 부러진 상태로, 골밀도가 낮은 노년층에서 뒤로 엉덩방아를 찧는 낙상과 함께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고관절이 골절되면 정상 보행이 어려워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욕창, 폐렴, 심장병 등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이어져 노년층에서는 ‘암보다도 무서운 질환’으로 불린다. 고관절 골절 시에는 부러진 뼈를 인공 관절로 교체하는 수술과 보행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재활을 실시하는데, 연령, 근력, 인지기능, 영양 상태 등의 요인이 환자마다 달라 정상 보행으로 회복할 확률은 개인마다 차이가 크다. 이 중 특히 근력은 보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수술 후 재활 치료에서

최근 급증하는 소아청소년의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을 진단하는 새 기준이 국내 연구진에의해 제시되었다.성인 진단기준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소아청소년 특성을 반영한 진단 기준값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연구팀에 제시한 이번 진단 기준은 간효소 수치가 정상인 경우에도 유효했다. 연구팀은 알라닌 아미노전이효소(ALT)가 정상인 청소년만 별도로 분석해도 FLI, HSI의 곡선하면적 값이 약 0.89~0.91 수준으로 높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겉으로 건강해보이는 소아청소년에게도 대사이상 지방간질환이 숨어있을 수 있으며, FLI, HSI 지표를 활용하면 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한국 국민영양건강조사(KNHANES)에 따르면, 우리나라 10~18세 아동청소년의 지방간질환 유병률이 최근 10년간 8%에서 12%로 크게 상승했다.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 MASLD)’은 비만 등의 대사이상을 동반한 지방간질환으로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소아청소년에게 발생하면 소아 당뇨병과 각종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도를

“저희 메디통은 기술 혁신을 통해 의료진에게는 업무의 효율과 자부심을, 환자에게는 신뢰와 안심을 주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이유엔 메디통 조수민 대표의 말이다. 조수민 대표는 이랜드, 인성정보, 대웅제약 영업소장 등을 거쳐 2012년 메디통을 설립하여 현재 600개 이상의 회원 병원이 가입을 한 의료기관 솔루션 플렛폼 기업으로 성장했다. 조수민 대표는 의료기관의 환자안전을 위한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해 왔다. 그리고 그 공로로서 2022년 과학기술통신부장관상을 비롯해 벤쳐창업진흥유공포상 중소벤쳐기업부장관표창(2022년), 과학기술진흥유공 정부포상 대통령표창 등을 수상하기도 했다. 먼저 대표님께서 운영하고 계신 회사, 메디통에 대한 소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통은 ‘의료(Medical)’와 통할 ‘통(通)’의 합성어로 ’의료 산업이 소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2012년 이유엔(주) 법인을 설립하고 헬스케어 브랜드‘ 메디통’을 론칭할 당시, 저희는 의료기관 평가인증 컨설팅을 주축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약 250여 곳의 병원 현장을 직접 발로 뛰며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문제가 ‘

“한국인은 위염과 위암 위험군” — 장상피화생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융합의과학교실 김혜성 교수와 병리학교실 장보근 교수 연구팀이 장상피화생이 위암으로 발전하는 전구병변임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증거를 세계 최초로 제시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에 따르면 헬리코박터 감염, 약물, 스트레스 등으로 생긴 위염은 만성화되면 위 점막이 심하게 손상되어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이어진다. 특히 불완전형 장상피화생은 기존 역학 연구에서 위암 위험이 10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다. ▲(왼쪽부터) 김혜성 교수 장보근 교수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위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로, 2020년 기준 전체 암의 14.2%가 위암이었으며, 인구 10만 명당 약 50~60명이 새로 진단될 정도로 발생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위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에 이르지만, 말기에 진단될 경우 생존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매년 480만명 이상이 위염 진단을 받고 있으며, 위 내시경을 시행 받은 환자의 20~30%에서 장상피화생이 관찰되고 있다. 특히 위축성 위염과 장상피화생은 위암의 전단계로 인식되고 있지만,

가톨릭대학교는 남재환 의생명과학과 교수 연구팀이 바이오 기업 SML바이오팜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개인 맞춤형 mRNA 암백신(PCV)을 개발하고, 동물 모델에서 강력한 항암 효과를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암 예방과 치료를 위한 개인 맞춤형 암백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mRNA 백신 기술의 안전성과 신속한 제조 역량이 입증되면서 암환자별 종양 특성에 맞춘 '맞춤형 치료 백신' 개발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바이오엔텍(BioNTech)과 모더나(Moderna)는 흑색종, 폐암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활발히 진행 중이며, 일부 백신은 수술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보조치료제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 남 재환 교수 이런 가운데 남재환 교수 연구팀은 국내 최초로 mRNA 플랫폼을 활용해 개인의 암 유전정보 기반의 치료용 백신을 직접 제작하고 동물실험을 통해 항암 효능을 입증했다. 대장암 마우스 모델을 대상으로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을 통해 암세포에만 존재하는 신생항원(neoantigen)을 선별한 뒤, mRNA 백신으로 제작해 지질나노입자(LNP)에 담아 주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로 치아 임플란트 보편 치료 시대에 접어들었다. 치과 임플란트는 상실된 치아를 대체하는 데 성공적으로 사용되며, 높은 내구성과 심미성을 가져 ‘제2의 영구치’라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염증성 질환(임플란트 주위 점막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발생할 수 있고,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제거 후 재수술까지 필요할 수 있다. 이를 예방하고자 임플란트 주위염 관련 치주과 전문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출한 합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consensus report)가 발표되었다. ▲(좌측부터) 서울성모 박준범_서울대 구기태 교수 김윤정 교수 (관악서울대학교치과병원, 제1저자), 송영우 과장 (중앙보훈병원, 제1저자), 박준범 교수 (서울성모병원 치주과, 교신저자), 구기태 교수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교신저자) 연구팀이 임플란트 주변 질환 원인, 진단, 치료, 관리에 대한 최신 지견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연구 보고서를 국제학술지 ‘Journal of Periodontal & Implant Science(JPIS)’ 최근호에 발표하였다. 보고서에서는 치의학계에서 저명한 Jan Derks 교수 연구팀의 체계적 문헌 고찰을 인용하

최근 60대(남) A씨는 사타구니 부위가 불룩하게 나왔다 들어가기를 반복해 병원을 찾았다가 탈장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는 통증이 없어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점점 크기가 커지고 불편감이 심해져 결국 수술을 권유받았다. 실제로 탈장은 중노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며, 무거운 물건을 자주 드는 일, 만성 기침이나 변비로 복압이 자주 올라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탈장은 복벽이 약해지거나 틈이 생기면서 장기나 지방조직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질환이다. 주로 사타구니, 배꼽이나 수술 상처 부위에서 발생하며, 나이가 들수록 근육 조직인 복벽이 약해져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건의료빅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약 8만 8천여 명이었던 탈장 진료 환자가 2024년에는 약 10만 명으로 늘어나며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이 높아 중장년층 이후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 ▲ 서 원준 교수 초기 탈장은 통증이 없거나 불룩함이 줄었다 다시 나오는 양상으로 방치되기 쉽지만, 장이 탈장낭에 끼어 혈류가 차단되면 ‘교액 탈장’이라는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이 괴사할 수 있으며, 장절제 가능성도 있다. 탈장은 자연 치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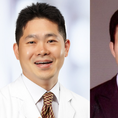
방사선 치료는 두경부암과 식도암 치료의 핵심적인 방법 중 하나로, 수술이나 항암화학요법과 함께 종양의 크기를 줄이거나 완전히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방사선은 암세포뿐 아니라 주변의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하장애, 구강건조증, 폐 섬유화, 장기 기능저하 등 다양한 후유증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상당한 빈도로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발생해 영구적인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환자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문제이지만, 지금껏 효과적인 예방이나 치료 방법이 없었다. 서울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김인걸 연구교수)·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양형철 교수(선경미 연구교수) 공동연구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식세포를 표적하는 혁신적인 나노입자를 개발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비인후과 정은재 교수, 의생명연구원 김인걸 연구교수 연구팀의 나노입자는 포스파티딜세린(phosphatidylserine)과 폴리에틸렌 글라이콜(polyethylene glycol)로 구성된 리포좀 형태다. 이 나노입자의 핵심 메커니즘은 항염증 효과와 항섬유화 효과를 동시에 나타낼 수 있도록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대식세포는